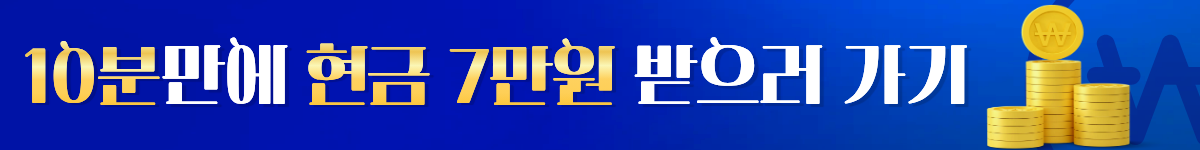후식 위장은 뇌에서 시작된다
식사 후에도 디저트를 찾는 이유는 뇌 신경세포 때문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저트 위장’ 현상은 뇌에서 비롯된다. 배부름을 느끼게 하는 신경세포가 동시에 단 음식을 더 찾도록 자극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는 이미 배가 부른 상태에서도 디저트를 섭취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포만감 조절하는 POMC 뉴런의 역할
해당 현상의 중심에는 ‘POMC 뉴런’이 있다. 이 뉴런은 당이 체내로 들어오면 활성화되며, 포만감을 유도하는 신호 분자를 방출한다.
동시에 몸에서 자체적으로 생성하는 아편 계열 물질인 β-엔도르핀도 분비된다.
β-엔도르핀은 특정 수용체를 가진 신경세포에 보상 반응을 일으켜 단 음식 섭취를 촉진한다.
중요한 점은 이 신경경로가 일반 음식이나 지방이 많은 음식을 먹었을 때는 활성화되지 않고, 오직 당분을 섭취했을 때만 작동한다는 것이다.
실험에서 이 경로를 차단하자 쥐들이 추가적인 당 섭취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효과는 이미 배부른 상태에서만 나타났다.
당을 감지하는 순간부터 작용하는 메커니즘
흥미로운 점은 실제로 당을 섭취하기 전부터 이 반응이 시작된다는 것이다.
쥐들은 당분을 감지하는 순간 β-엔도르핀을 분비했으며, 이는 이전에 당을 먹어본 적이 없는 쥐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인간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도 유사한 반응이 확인됐다.
연구진이 자원자들에게 설탕 용액을 제공한 후 뇌를 촬영한 결과, 쥐의 POMC 뉴런이 반응한 뇌 부위가 인간에서도 동일하게 활성화됨이 입증됐다.
진화적 관점에서 본 당분 선호 현상
진화적으로 볼 때, 당분을 찾으려는 성향은 생존에 유리한 요소일 수 있다.
당분은 자연에서 쉽게 얻기 어려우면서도 높은 에너지를 공급하는 원천이기 때문에, 뇌가 이를 선호하도록 프로그래밍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비만 치료에 미칠 영향
이번 연구는 비만 치료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현재 뇌의 아편 수용체를 차단하는 약물이 존재하지만, 이는 체중 감량 효과가 식욕 억제 주사보다 낮다고 알려져 있다.
연구진은 이러한 기전을 활용한 종합적인 치료법이 더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원문 보러가기